이야기는 제우스가 알크 메네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우는 데서 비롯되지요. 제우스가 알크메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저 유명한 헤라클레스입니다. 제우스가 외도를 해 애까지 낳은 사실은 제우스의 부인 헤라 여신의 큰 분노를 삽니다. 미칠 듯이 화가 난 헤라 여신은 어떻게 해서든 '저주스러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 하지요. 그러자 알크메네는 온 가족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아기를 성밖에 내다 버립니다. 가여운 아기는 허기와 따가운 햇살에 지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제우스는 버려진 아기를 안고 몰래 천궁으로 올라옵니다. 우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급선무였지요. 부성애에 사로잡힌 제우스는 앞 뒤 가리지 않고 아내 헤라의 처소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헤라 여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도 크다고나 해야 할까, 제우스는 헤라가 잠든 틈을 타 아기 헤라클레스에게 여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여신의 젖을 있는 힘껏 빨았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결코 젖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가슴이 심히 불편해진 헤라 여신. 급기야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제우스는 강제로 아기를 떼어놓았지요. 그러자 여신의 가슴에서 젖이 하늘로 분수 같이 솟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점점이 박힌 젖은 무수한 별들의 군집, 곧 은하수가 됐지요. 은하수가 '젖의 길 (Milky Way)'로 불리게 된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담으로 땅에 떨어진 젖은 백합꽃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우스의 부성애가 아름다운 은하수의 탄생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코믹하면서도 훈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악명 높은 바람둥이라도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은 여느 아버지 못지 않았던 거지요. 물론 헤라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죽을 때까지 그를 갖가지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헤라 여신도 알고 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영웅이라는 것을. 그는 다름 아닌 헤라 여신의 젖을 먹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젖을 물린 사람은 자신의 젖을 먹은 아이를 결코 미워할 수 없지요. 비록 제우스의 외도에 대한 단죄의 표시로 헤라클레스에게 시련을 더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젖을 먹은 헤라클레스가 끝내 이겨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헤라클레스('헤라의 영광'이라는 뜻)라는 이름에 이미 헤라 여신의 깊은 속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시련을 이긴 자는 누구나 다 이 위대한 여신의 자녀요 그녀의 영광입니다
이상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서양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를 미리내라고 불렀습니다. 미리내는 미르와 내가 합하여진 단어인데 미르는 용을 가르키는 우리말이며 내는 물(시냇물) 혹은 강을 가르키는 단어의 우리말이다. 두단어를 합하면 용이 사는 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하수가 미리내(용이 사는 물)가 되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용이란 동물을 지금처럼 환상의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신비의 동물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동물로 믿었다. 그 용은 우리나라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으로 비유되기도 했으며 임금의 권위를 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의 앉는 의자는 용좌 임금이 입는 옷은 곤룡포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영광을 의미하며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했습니다. 이 용은 지상에 있을 때는 용이 아닌 다른 동물(이무기나 혹은 잉어등)이 수백년의 도를 닦고 하늘의 옥황제의 허락을 받아 용이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동물로 믿었지요. 승천한 용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용이 살아갈 물이 필요한 것이다. 과연 용이 살아갈만한 물이 어디 있을까하고 하늘 을보며 찾던 중 하늘을 가로 지르는 큰 강을 발견했다.
아하!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곳이 저 강이구나.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용이 사는 물(미르내)인 것이다. 이단어가 변하여 미리내가 되었고 지금의 은하수를 뜻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견우·직녀의 애틋한 사랑 담은 여름 밤하늘에 흐르는 ‘별의 강’
여름 밤하늘에는 많은 별빛이 모여 젖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강이 펼쳐진다. 바로 은하수다. 옛사람들은 하늘강에 용이 산다고 믿어 ‘미리내’라 부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윤극영이 작사·작곡한 ‘반달’이란 동요에도 등장하는 은하수는 사랑과 이별의 장소다.
전설에 따르면 항아 선녀가 샛별 총각한테 반해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하얀 달을 쪽배 삼아 타고 은하수를 오가면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한다. 이때 배를 매어 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나루터라고 알려져 있는 천진 별자리다. 천진 별자리는 서양의 백조자리에서 날개를 이루는 별들이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 사랑에 빠진 곳도 바로 은하수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견우와 직녀를 떼어 놓느라 넓힌 곳 또한 은하수다. 은하수는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이별의 상징인 셈이다.
은하수에는 또 다른 전설이 내려온다. 중국 동진에 왕희지란 사람이 살았는데 붓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그는 처갓집에 찾아갔는데 장인이 명필인 사위에게 붓글씨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왕희지는 큼직하게 한 일(一)자 하나를 써 주었다. 하지만 장인은 ‘고작 한 일자 한 획을 찍 그어 주다니’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사위를 원망했다.
그런데 왕희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장인은 밤마다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다. 자신이 집 밖에서 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장인은 영문을 몰라 왕희지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왕희지는 글을 쓰던 그 밤에 은하수가 너무 아름다워 그 정기를 모아 은하수 모양처럼 한 획을 죽 그어 한 일자를 썼다고 설명했다.
왕희지가 쓴 한 일자에서 은하수의 정기가 발산돼 장인이 밤마다 집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은하수의 정체는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발명하면서 밝혀졌다. 젖이 흐르는 하늘강인 줄로만 알았던 은하수를 천체망원경으로 바라보니, 거기엔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잔별이 모여서 희미하게 퍼져 보이는 것이 바로 은하수였던 셈이다.
도시의 밤하늘에선 은하수뿐 아니라 어두운 별도 보기 힘들다. 전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고작해야 달이나 밝은 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은하수는 인공적인 불빛이 없는 시골에서 즐길 수 있다.
올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은하수를 직접 만나러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글 - 동아사이언스 이충환, 사진 - 박승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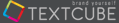


댓글을 달아 주세요